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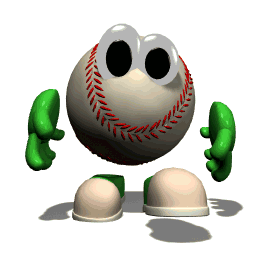
2008. 10. 14
두산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훈련을 하던 지난 14일, 잠실구장은 가을 날씨답지 않게 뜨거웠다. 마치 고등학교 야구부처럼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훈련을 하던 두산 선수들의 열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두 한여름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투수 이승학이 제일 컸다. 수비 포메이션 훈련 때 공이 굴러올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두산 김경문 감독은 “사실 (이)승학이를 엔트리에서 빼려다가 훈련 때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포스트시즌에서는 더그아웃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문득 LA 다저스 토미 라소다 부사장이 생각났다. 선수였던 1954년 시즌 중반, 라소다는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거가 됐다. 부푼 마음으로 불펜 피칭을 하며 등판 기회를 노렸지만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윌터 앨스턴 감독에게 따졌다. “등판도 안 시킬 거면서 왜 나를 메이저리그에 올렸냐”고. 앨스턴 감독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네가 벤치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 네가 소리 지르면 분위기가 한결 살아나거든. 난 네가 그 일을 해주길 바라며 데려온 거야.” 라소다는 그 열정적인 ‘파이팅’으로 메이저리그 명감독이 됐다. 혹시 이승학도?
사실 이날 제일 목소리가 컸던 사람은 불펜에서 두산 투수들의 피칭을 지켜 보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영재 심판이었다. 두산 투수들이 불펜 피칭을 할 때마다 최수원 심판과 함께 고래고래 “스트라이크”를 외쳤다. 이영재 심판은 한국 심판 중 목소리가 제일 크다. 땀도 선수보다 더 많이 흘리고 있었다. 무거운 보호대를 차고 그 위에 심판복까지 입었으니 오죽 더웠을까.
이유를 물으니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0.4초 만에 날아오는 공이 ‘가상의 사각형’을 통과하는지 300번 이상 확인해야 하는 직업이다. “며칠이라도 쉬면 감각과 집중력이 떨어져 안된다”고 했다. 몇몇 심판은 지금도 SK 훈련에 참가해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가을야구를 앞둔 ‘정밀 분석’은 구단만 하는 게 아니다. 심판들도 분석을 한다. 최 심판은 “더욱 정확한 스트라이크 판정을 위해 투수들의 궤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을 받은 포수 미트 위치가 아니라 투구의 궤적이 가상의 존을 통과하느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심판은 “두산 이용찬의 경우 정규 시즌에서 별로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 궤적을 봐 둘 필요가 있다”며 이용찬의 투구에 집중하기도 했다.
심판의 가을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기 몸살 예방은 필수. 이 심판은 “포스트시즌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 경기 끝나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몸살에 걸리기 딱이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 지장을 준다”고 했다.
수확의 계절 가을. 선수도, 심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야구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이용균 기자
경향신문
'--이용균 야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이스볼 라운지] 다시 시작하는 그들에게 격려를 (0) | 2023.05.20 |
|---|---|
| [베이스볼 라운지] 태도가 낳은 ‘다이아몬드 혁명’ (0) | 2023.05.07 |
| [베이스볼 라운지] 선수 내쫓는 ‘FA족쇄’ (0) | 2023.04.25 |
| [베이스볼 라운지] 또 사라지는 야구장 (0) | 2023.04.14 |
| [베이스볼 라운지] 포수의 기본은 ‘소통’ (0) | 2023.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