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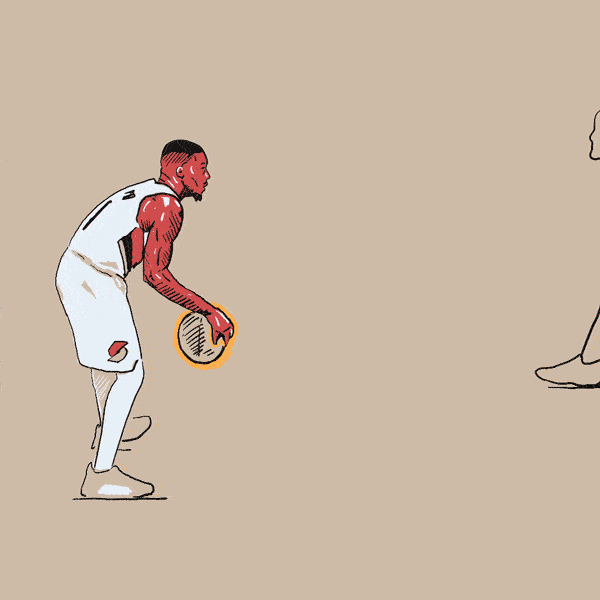
2019. 05. 24
막대한 자본,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10년 넘게 한 팀에서만 활약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통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기도 하며, 트레이드 또는 방출로 인해 금세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로 무대다. 이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 10년 넘게 한 팀에서만 활약하는 주인공들, 우리는 그들을 ‘원 클럽맨’이라고 부른다.
1997년 출범 이래 한국농구연맹(KBL)은 2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창기 8개 구단으로 시작했고, 1997-1998시즌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 구단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백, 수천명의 프로 선수들이 데뷔와 은퇴를 반복했다.
그중에서도 몇몇 선수들은 신인 시절부터 은퇴 시즌까지 한 구단에서만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다. 팬들이 사랑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며 특출난 이들은 코치 및 감독의 자리까지 앉았다.

◇ KBL의 대표 원 클럽맨은 누구?
대표적인 예는 2017-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김주성이다. 2002-2003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총 742경기를 원주에서만 뛰었다. 통산 기록은 평균 13.8득점 5.9리바운드 2.6어시스트 1.4블록. 챔피언결정전 우승 3회, 정규리그 우승 5회, 정규리그 및 챔피언결정전 MVP 각각 2회 등 전무후무한 원주 및 KBL 최고의 스타였다.
김주성에 이어 한 구단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추승균 전 KCC 감독이다. 추승균 감독은 1997-1998시즌부터 2011-2012시즌까지 총 738경기를 뛰었으며, 평균 13.5득점 2.3리바운드 2.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우승 횟수는 김주성보다 많다. 5차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경험했으며 서장훈에 이어 두 번째 1만 득점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병철 오리온 코치 역시 원 클럽맨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대구 동양, 오리온스를 거치며 총 556경기를 소화했고, 평균 13.0득점 2.2리바운드 3.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01-2002시즌 김승현, 전희철, 마르커스 힉스, 라이언 페리맨과 함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규섭 삼성 코치도 KBL 대표 원 클럽맨으로 꼽힌다. 2000-2001시즌부터 2012-2013시즌까지 무려 11시즌을 뛰었고, 522경기를 출전했다. 2000년대 중반, 삼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박구영 현대모비스 코치(모비스/현대모비스), 은희석 연세대 감독(SBS/KT&G/KGC인삼공사), 이시준 KEB하나은행 코치(삼성), 김봉수(동부) 역시 원 클럽맨의 대명사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하승진(KCC) 역시 2008-2009시즌부터 2018-2019시즌까지 11시즌을 KCC에서만 보냈다.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한 구단에서만 뛰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원 클럽맨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전설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선수는 현대모비스 왕조를 건설한 양동근과 함지훈. 양동근은 13시즌, 함지훈은 11시즌을 현대모비스에서만 몸담고 있다. 이미 이뤄놓은 성과 역시 앞서 언급한 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5년, 아니 10년 뒤 KBL 최고의 원 클럽맨을 꼽을 때 양동근과 함지훈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다.
KGC인삼공사의 양희종, 전자랜드의 정영삼, 정병국, KCC의 신명호 등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 미래의 원 클럽맨 코치들에게 전하는 조언
앞서 언급한 KBL의 대표 원 클럽맨들의 공통점은 은퇴 후, 자신들이 뛰었던 구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주성은 6월부터 합류 예정). 10년 넘게 뛴 구단에서 코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다.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범, 추승균 감독은 현역 은퇴 후, 코치 및 감독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상범 DB 감독은 SBS에서 은퇴 후, 코치가 됐고 2009-2010시즌부터는 정식 지휘봉을 잡았다. 추승균 감독 역시 2011-2012시즌 은퇴하자마자 코치로 합류했으며 2015-2016시즌 감독이 되자마자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김병철, 이규섭 코치는 여전히 오리온, 삼성에 있으며 김주성 역시 6월부터 DB의 세 번째 코치로 부임할 예정이다. 전통과 역사가 중요한 프로 스포츠에서 원 클럽맨이 그대로 지도자가 된다는 건 큰 의미로 다가온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어제까지 형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코치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코치가 된 당사자도 마찬가지. 선수와 코치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듯 코치 적응기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처음부터 편하게 다가가거나 아예 공과 사를 구분하는 등 여러 방법이 존재했다.
먼저 이규섭 코치는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며 코치로서의 변신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었지만, 모두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을 선택했고, 그건 거리감을 두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맏형으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코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밖에서도 최대한 안 만나려고 했고, 이제는 형, 동생이 아닌 선수와 코치의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이규섭 코치의 말이다.
모두가 환영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규섭 코치 역시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 미국에서 코치 연수를 받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나온 결론이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벽을 치지 않는다(웃음). 코치로서의 첫 시즌 때만 그런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가가기도 한다”며 웃음 지었다.
이규섭 코치와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인 건 추승균 감독이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KCC의 분위기도 크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황금기를 같이 했던 이들과 서슴없이 지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바라봤다.
“만약 나와 함께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았다면 엄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퇴 시즌을 마치고 곧바로 코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선을 긋기가 힘들었다. 물론 코트 안에서는 코치로서의 존중을 받았지만, 밖에서는 친한 형이 됐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었다.”
단순히 관계에 대한 적응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선수 때와는 달리 가르치는 입장이 됐기에 모든 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특히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며 실수를 줄이려 했다.
이규섭 코치는 “아무리 베테랑 선수였다고 해도 코치가 되면 어색해진다. 그렇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오늘 훈련에 대해 미리 연습도 해보고, 선수가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려 했다”고 말했다.
추승균 감독 역시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은 정말 다르다. 또 코트 위에서 뛰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며 이규섭 코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선수 인생의 전부를 바친 구단에서 코치 및 감독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 단순히 의리 하나만으로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김주성을 시작으로 많은 선수들이 원 클럽맨 코치의 길을 걸을 예정이다. 아직 출중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양동근 역시 현대모비스와 1년 계약을 맺으며 같은 길을 걸을 것이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들이 지도자의 입장으로 팀에 남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스토리 텔링이 있을까.
추승균 감독은 “(김)주성이를 비롯해 앞으로 많은 은퇴 선수들이 자신의 구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한다. 한 구단에서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적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프로 세계에선 더더욱 그렇다. 후배들이 열심히 잘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민준구 기자 minjungu@jumpball.co.kr
점프볼
'--민준구 농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타임머신] '위대한 도전' NCAA 개척 나섰던 이은정·최진수·신재영 (0) | 2022.11.11 |
|---|---|
| [타임머신] 예고 없었던 이별, 이상민의 아쉬웠던 이적 (0) | 2022.11.11 |
| [타임머신] 인생의 전환점이 된 보상선수 지명, 송영진의 인생역전 (0) | 2022.11.11 |
| [타임머신] "팬이 있기에 선수가 있다" KBL의 팬 서비스 역사 (0) | 2022.11.10 |
| [타임머신] 모비스가 일군 기적, 2014 윌리엄존스컵 우승 (0) | 2022.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