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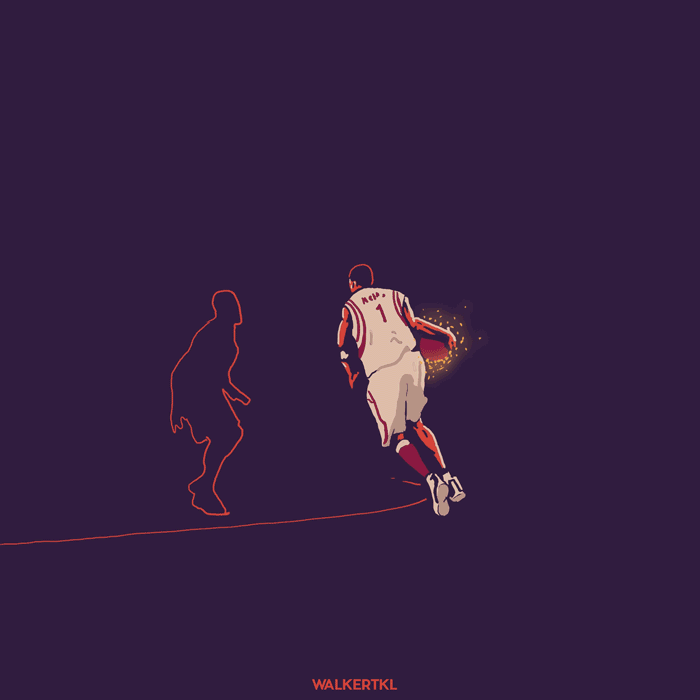
2022. 06. 13
농구 앞을 막아선 축구
우리나라 남자농구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부터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까지 3년간 전성시대를 누렸다. 필리핀, 일본, 대만, 이스라엘이 우승을 다투던 때였지만, 3년간 승자는 한국이었다. 이스라엘은 유럽에서 버림받고, 1974년까지 아시아로 출전했다. 농구가 강했다. 1966년과 1974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했다. 그 후 중국의 등장과 중동국가 반대로 축출당하며 아시아 무대에서 사라졌다.

남자농구가 이룩한 1969년 아시아선수권, 1970년 아시안게임 우승은 유사 이래 처음이어서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특히 강적 이스라엘을 꺾고 따낸 금메달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 남자농구가 우승할 때마다 축구가 찬물을 뿌렸다. 1969년 태국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할 때, 축구가 같은 장소에서 킹스 컵 대회, 1등을 했다. 농구는 2년마다 열리는 큰 대회였지만, 축구는 태국 정부가 창설한 1회 대회였다. 참가국도 적었다. 남자농구의 최초 우승에 축구가 김을 뺀 것이다. 1년 후, 1970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강호 이스라엘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축구는 버마(미얀마)와 공동우승을 했다. 승부차기가 없던 시절이다. 또다시 농구 우승의 영광에 재를 뿌리고 초를 쳤다.
아시아경기대회 단장은 장덕진 축구협회장이었다. 대회 시작 전, 금메달을 따면 1인당 100불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100불은 큰돈으로 공무원 월급 두 달 치였다. 우리는 1인당 100불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선수단 단장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우리 팀에게는 회식이나 하라는 말과 함께 고작 300불이 왔다. 인원이 많은 축구선수에겐 1인당 100달러 등 총 3천여 달러를 썼다는 말이 돌았다. 화가 난 농구단은 주장인 김영일 선배를 통해 즉시 단장에게 회식비를 반납했다. 그래서 부족한 단비로 조촐한 우승 파티를 했지만, 아시안게임 첫 우승이라는 뿌듯함에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농구는 이제 목을 축이기 시작했는데 말야”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촌이 없었다. 국가마다 호텔을 숙소로 배정했다. 한국 선수단 숙소는 ‘마노라’ 호텔이었다. 남자농구는 축구보다 하루 먼저 금메달을 땄다.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을 마친 후 호텔 앞 일본 음식점(후지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맥주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축구선수들이 버마와 공동우승을 한 후 식당에 들어왔다. 오인복(골키퍼), 김기복, 이회택, 홍인웅, 박이천, 최재모, 정규풍등 7명이었다. 술이 약한 김호, 김정남은 빠졌다. 농구는 8명이었다. 김영일, 김인건, 이인표, 신동파, 박한, 최종규, 곽현채, 그리고 나였다. 그동안 소소한 감정의 앙금이 있는 축구선수들을 혼내주자는 의견이 눈짓을 통해 투합되었다.
술 마시기 경쟁을 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축구선수들은 자기 무덤을 판 것이다. 마주 보고 앉아 두 사람이 잔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마시기 시작했다. 태국 맥주는 독하므로 필리핀 맥주 ‘산미구엘’로 정했다. 밤 10시부터 시작한 술 시합은 2시간이 채 안 되어 결판이 났다. 축구 선수 전원이 토했다. 오인복, 이회택, 등은 일찍 자리를 떴고, 막판에 박이천, 정규풍, 최재모만 남았다. 세 명은 나와 67학번 동기이고 축구팀 막내들이었다. 젊은 혈기로 끝까지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막판에 최재모 혼자 혼신을 다하다 쓰러졌다.

적수가 모두 쓰러지자 박한 선배가 한마디 했다. “농구는 이제 목을 축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끼리 한잔 더하지!”라며 득의양양 마셔댔다. 몸 흐트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농구팀의 대승이었다. 일부 축구선수는 현장에서 오줌까지 싸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 후 축구 선수들은 우리를 만나면 “너희가 인간이냐? 짐승이지”라며 비아냥거렸다.
얼마 후 농구, 축구 술 시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다음 날 새벽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몇 명의 축구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고, 어떤 선수는 화장실에 잠들어 있었다. 힘들게 공항으로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인사불성이었다. 동행했던 기자분들이 축구선수들의 몰골과 술 냄새 때문에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농구선수들의 술 실력이 전 종목 선수 중 최고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나도 술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마시지만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필름이 끊어진 적이 거의 없다. 그 정도까지는 마시질 않는다. 하지만 농구계에는 전설적인 대 주가가 많이 있다. 모 대학 P모 감독은 선수 시절 학교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농구, 럭비선수 6명이 소주 100병을 들이켠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오후 3시부터 마신 술병을 방안에 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증명이 된 것이다.
먹다 보니 70병이 넘었고, 100병을 마셨는데 결국 술이 없어 끝냈다고 하니 사람인지 고래인지...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농구선수의 술 센 이유는 키가 커서 ‘장’이 길기 때문이라고 한다. 키가 큰 배구선수들은 비교적 술이 약하다. 내가 보기에는 장과는 상관없고 술 많이 마시는 것은 정신력과 체력이라고 생각한다. 농구선수는 축구보다 신장이 크고 많이 뛰어야 한다. 지구력, 순발력이 좋아 체력이 강하다. 체구가 작은 축구선수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오기도 작용했다고 본다.
고교 때 스승인 전규삼 선생님께서 선수 생활 중에 술, 담배, 여자를 멀리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 술도 시합이 끝나는 날에 주로 마셨다. 우승하면 기뻐서 마시고, 패하면 분하고 땀 흘리며 고생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요즘 간혹 지인들을 만나 한잔할 때면 문득문득 젊은 시절 객기부린 일화들이 추억처럼 떠오른다.
유희형 / 전 KBL 심판위원장
점프볼
'--유희형 농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삶 나의 농구] ㉒ 쿠웨이트 농구 코치가 되다 (0) | 2022.11.19 |
|---|---|
| [나의 삶 나의 농구] ㉑ 농구코트 위 엔테베 작전 (0) | 2022.11.19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⑲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0) | 2022.11.18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⑱ 그리스국제올림픽 아카데미를 가다 (0) | 2022.11.18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⑰ 히딩크 같은 지도자를 만나다 (0) | 2022.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