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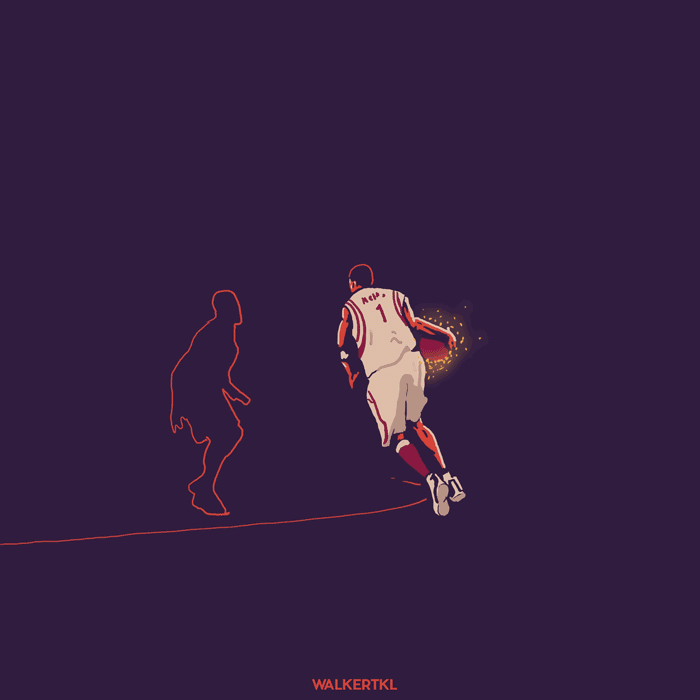
2022. 05. 05
“농구한 놈이 왜 축구판에 와서 설쳐!”
1996년 5월, 2002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지가 발표됐다.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했던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로 결정되었다. 양국에 명분을 준 것이다.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에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6개월 후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박세직 씨가 위원장에 취임했다. 서울올림픽을 준비했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한 임명이었다. 문화체육부에서 조직위로 파견된 나는 박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 후 의전 부장, 등록본부장을 맡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해 8월까지 근무했다.
그곳에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육체적 고통도 심했다. 축구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다. 농구 한 놈이 축구판에 와서 설친다고 비난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모든 행사의 사회를 내가 맡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로 나가는 엠블럼, 로고 발표 등 굵직한 행사의 진행을 내가 도맡았다. 상부의 지시로 사회를 본 것이다. 외부 아나운서는 회당 500만 원이었다.
박세직 위원장 비서실장직은 나에게 버겁고 힘든 자리였다. 일벌레로 유명한 박 위원장을 보좌하는데 비서 경험이 없는 관계로 힘이 들었다.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7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 퇴근했다. 출근 시 11층 집무실을 걸어서 올라간다. 98년 당시 65세인 위원장을 50세인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분은 잠이 없는 분이다. 하루에 2, 3시간 정도 잔다. 그해 6월 프랑스에서 확인한 것이다.

6월 12일에 개막된 프랑스 월드컵에 두 번 수행했다. 개막식을 참관하고 다음 날 한국과 멕시코전이 열리는 리옹으로 이동했다. 서울-부산보다 먼 거리인데 버스를 고집했다. 왕복 12시간이 소요되었다. 멕시코에 3:1로 패한 경기를 보고 파리로 돌아왔다. 새벽 2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내일 아침 5시 모닝콜을 해놓으라고 지시한다. 3시간 후 방엘 가니 한국에 전화하고 있었다. 어려웠던 것이 또 있었다. VIP를 만날 때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촬영했는데, 자료실 보관에 그쳤다.
대회 도중 일정이 없는 날이 있었다. 쉬는가 했는데, 암스테르담에 있는 아약스구장의 잔디를 보러 가겠다고 했다. 고속열차(테제베)로 4시간을 가야 한다. 네덜란드 대사관에 연락하고, 암스테르담으로 향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구해준 기차의 좌석이 위원장은 일등석 앞칸, 나는 삼등석으로 맨 뒤쪽이었다. 식사 등을 챙기기 위해 위원장 좌석을 가려면 7칸을 건너가야 한다. 암스테르담역에 내리자마자 큰 가방을 들고 앞칸까지 뛰었다. 양복이 흠뻑 젖었다. 네덜란드 명문구단인 아약스구장의 시설은 훌륭했다. 경기장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에 지하철역이 있다. 잔디 상태는 좋지 않았다. 파리역에 도착하니 밤 12시, 항상 자정이 넘어야 일이 끝났다.
건강을 자신하며 휴식을 모르고 일만 하시던 박세직 위원장이 2009년 7월, 76세에 급성폐렴으로 별세했다. 향군회장직을 연임하고 나서다. 업무를 열성적으로 추진하다 건강을 잃은 것이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다. 업무에만 열중한 이유가 있다. 한번 좌절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수경사령관으로 잘 나가다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육사 17기 후배들에게 당한 것이다. 그때부터 일만 하는 분이 되었다. 그 후 총무처장관, 체육부장관, 올림픽조직위원장, 안기부장, 서울시장으로 승승장구했다.

월드컵 빛낸 VIP 의전
나는 의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3년간 일했다. 동시 통역사 관리와 VIP 공항 영접이 주 업무였다. FIFA 회장단을 비롯한 각국의 축구 관련 귀빈들을 영접했다. 당시 FIFA 회장은 제프 블라터였는데 항상 미모의 금발 여비서와 동행했다. 공항 귀빈실에 오면 여비서를 상석에 앉게 한다. 이해를 못 했는데 알고 보니 블라터의 애인이란다. 본처가 버젓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거스 히딩크 감독도 같았다.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조직위에서 마지막 근무했던 곳이 등록부였다. 내가 본부장을 맡았다. 중요한 직책이었다.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두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회 관련, 모든 관계자에게 출입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카드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두 우리가 했다. 일본 조직위가 제작비를 핑계로 떠넘긴 것이다. 한, 일각 7만 개씩 모두 14만 개를 우리가 주도해서 발급했다.
단일 대회의 출입 카드는 AD카드(Accreditation Card)라고 한다. 분야별로 출입 가능 지역이 정해지고 번호로 표시되어있다. 올림픽 선수단에 지급되는 카드는 ID 카드(Identify Card)라고 한다. 당사자의 신원보증과 입국비자까지 겸용하는 것이다.
카드디자인이 결정되기까지 취리히와 일본에서 회의도 많이 가졌다. 대회가 임박 해 카드를 신청하면 내가 최종 사인을 해야 발급된다. 출전국의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는 미리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힘든 것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각국의 미신청자들인데, 임시출입증 발급을 요구한다. 서울 코엑스에 마련된 등록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120명이 2교대로 분주하게 카드를 만들어주었다. 대기표를 뽑고 3분이면 사진이 담긴 예쁜 카드를 목에 걸고 나온다. 펠레의 한국인 운전기사가 끈질기게 출입 카드 요청을 했지만, 끝내 불허했다.

붉은 악마가 시작한 응원의 물결, 전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4강 신화, 전 세계가 감탄한 감동의 현장에는 한국인의 우수성이 있었다. 넓은 광장마다 우리의 IT 기술로 대형 전광판을 설치, 생생한 실황중계를 보며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5년간 새로운 분야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 단언컨대 국제대회 준비와 외국 손님 접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한다. 성심성의껏 모시고 최선을 다한다.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5년간 조직위 전 직원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희형 / 전 KBL 심판위원장
점프볼
'--유희형 농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삶 나의 농구] ㉑ 농구코트 위 엔테베 작전 (0) | 2022.11.19 |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⑳ 1970년, 농구 대 축구 술 마시기 (0) | 2022.11.18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⑱ 그리스국제올림픽 아카데미를 가다 (0) | 2022.11.18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⑰ 히딩크 같은 지도자를 만나다 (0) | 2022.11.17 |
| [나의 삶 나의 농구] ⑯ 비난받는 자리, KBL 심판위원장 (0) | 2022.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