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2008. 09. 09
투수가 ‘새가슴’으로 낙인 찍히는 길은 아주 짧고 간단하다. 있는 힘껏 던진 초구가 파울이 되면 볼카운트 1-0. 2구째 유인구에 방망이가 나오지 않아 1-1. 3구째 사인은 대개 바깥쪽. 이게 공 반 개만큼 빠지면 1-2. 큰 것 맞지 않도록 포수가 요구한 변화구에 타자가 속지 않으면 어느새 1-3. 이제 이판사판이다. 신인급 투수에게 기회는 많지 않다. 온 힘을 다해 던진 직구. 빠지면 볼넷, 몰리면 장타. 어느 쪽이든 똑같다. 힐끔 쳐다본 더그아웃. 투수코치와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다. 자, 이제 ‘새가슴 투수’ 결정. 또는 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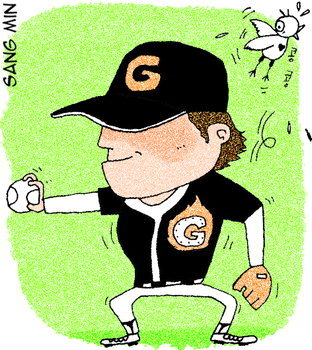
1m88의 큰 키. 시속 140㎞를 가뿐히 넘기는 왼손 투수. 2000년 해태 신인 강영식은 당시 김응용 감독의 총애를 받았다. 덩치 큰 왼손이라면 타자건 투수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김 감독이었다. 강영식을 자신의 집으로 거둬 손수 밥을 해 먹여 키웠다. 김 감독은 “내가 매일 아침 직접 햄을 구워 먹였다”며 웃었다. 삼성 감독으로 옮기자 신동주를 보내면서까지 강영식을 데려왔다. 강영식은 전지훈련에서 설을 맞을 때마다 김 감독 방으로 세배를 하러 갔다.
하지만 강영식은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공 빠르기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경쓰이는 녀석이 있었다. 2002년 삼성이 1차 지명한 투수는 더 큰 키에 더 빠른 시속 150㎞짜리 공을 자신과 똑같은 왼손으로 던졌다.
권혁이었다. 경쟁이 시작됐다. 구속에만 신경쓰다 보니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조금씩 빠졌다. 그럴 때마다 ‘새가슴’이라는 낙인이 덧칠됐다. 거기에 얹힌 김 감독의 총애는 더 큰 부담으로 강영식을 짓눌렀다.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도망갈 구석을 찾고 있었다. 부담감이 너무 컸다”며 그때를 떠올렸다. 부담감과 새가슴이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 그리고 지난 겨울 강영식은 롯데로 트레이드됐다.
유니폼을 갈아입은 강영식은 심장도 갈아치운 듯했다. 2008년 후반기, 강영식은 롯데 불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최근 17경기에서 겨우 두 차례만 실점했다. 시속 140㎞를 넘는 슬라이더와 컷 패스트볼은 오히려 우타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불안했던 롯데 불펜은 강영식의 부활로 돌담을 쌓은 듯 탄탄해졌다. 새가슴 투수의 대변신?
강영식은 “달라진 건 없다. 다만 그때는 마운드에서 부담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감은 당연히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선 ‘맞지 말라’고 하지 않고, ‘승부해서 이겨라’라고 주문한다”고 했다. “혹시 점수를 주더라도 꾸중 대신 위로가 내게 왔다”고 덧붙였다.
부담감은 새가슴을 낳고, 책임감은 에이스를 낳는다. 그리고 그 차이는 볼카운트 1-2에서 도망가느냐 승부하느냐에 달렸다. 인생도 마찬가지. 자 당신은 지금 볼카운트 1-2. 뭘 던지겠습니까
이용균 기자
경향신문
'--이용균 야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이스볼 라운지] 포수의 기본은 ‘소통’ (0) | 2023.04.12 |
|---|---|
| [베이스볼 라운지] 한화의 '9월 위기설' (0) | 2023.04.08 |
| [베이스볼 라운지] 임태훈 “만만한 직구 때문에…” (0) | 2023.04.05 |
| [베이스볼 라운지] 승엽, 등번호를 감춰라 (0) | 2023.04.03 |
| [베이스볼 라운지] '거인(巨人)의 추억' (0) | 2023.04.02 |




